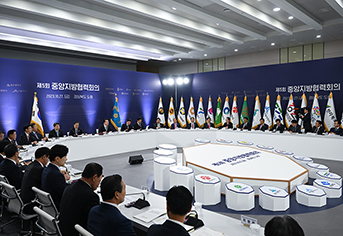‘박사님, 토판염전에서 첫 소금 채렴하는 데 오시겠어요’,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14년 전인 2009년 5월 9일이었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었다.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후 갯벌소금과 천일염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광주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하의도를 거쳐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 도착했다. 새로 지은 소금창고에 송진향이 채 가시지 않았다. 토판염전에서 채렴을 하기 위해 묵직한 고무래도 새로 만들었다.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난 70대, 80대 노인들에게 물어서 재현한 것들이다. 박씨도 젊었을 때 어렴풋이 아버지와 형님이 토판염에서 소금을 걷었던 일이 떠 올랐다.
흰 장화에 검은 바지 그리고 줄무늬 셔츠를 입은 박씨는 아내와 함께 간단한 고사상과 이웃에서 염전을 하는 주민 몇 분을 초대했다. 당시 소금 공부를 하다 인연이 되어 나도 초대됐다. 그렇게 박씨 부부는 아버지, 형님이 생계를 잇던 소금밭을 이어받아 천일염을 생산하다가 1970년대 이전 천일염 생산방식인 토판염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염전은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이루어져 있다. 저수지는 바닷물을 보관하는 곳이며, 증발지는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해 염도를 높이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결정지는 높은 염도의 함수를 이용해 소금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 결정지에 옹기 조각, 장판, 타일 등을 깔아서 생산량을 높이고 채렴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재질을 바닥재라고 하는데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된 후 친환경 바닥재를 개발하는 연구와 채렴할 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화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됐다.
그리고 많은 천일염 생산자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그런데 박씨는 오히려 30여년 시간을 거슬러 바닥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갯벌을 결정지 바닥을 다져서 소금을 생산하는 토판염을 선택한 것이다.

3대가 머무는 소금밭
지난 5월 토판염을 응원하는 사람 20여 명이 소금밭에 모였다. 벌써 14년째다. 코로나 기간에도 가족들만 모여서 5월에 소금고사를 지냈다. 소금고사는 토판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행객들에게는 소금밭여행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책이나 민속박물관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지난 00년에는 임방울대회에서 장원을 했던 소리꾼이 찾아와 판소리까지 곁들여 참가자는 물론 소금밭 주인들의 자존감도 한껏 올라가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이탈리아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찾아와 소금고사는 물론, 토판염생산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소금밭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족이 늘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 염부가 되겠다고 섬으로 들어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결혼해서 아내까지 소금밭에 머물면서 2대가 지키는 염전이 되었다. 소금고사는 매년 5월 어김없이 이어졌고, 찾는 사람도 관심을 갖는 사람도 늘었다. 또 박씨의 염전을 보고서 깨끗한 소금밭과 생산된 토판소금을 한알 한알 살펴서 이물질을 추려내고 세척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고 단골이 늘어났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면서 이제 3대가 머무는 소금밭이 되었다. 토판염을 생산하는 곳도 귀하지만 3대가 머무는 소금밭은 더 귀할 것이다. 대부분 큰 염전을 운영하는 경우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박씨의 염전은 아들 부부와 함께 오롯이 가족노동으로 소금밭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어리지만 두 명의 손자 중 한 명은 벌써 장래에 소금장인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소금밭 여행은 소금고사만 아니라 토판염 채렴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염전을 돌아보면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박씨로부터 상세하게 듣기도 한다. 또 신의면 상하태도와 하의면 하의도를 돌아보는 섬 여행도 함께 한다. 무엇보다 행복한 일은 박씨의 아내가 섬에서 나는 것으로 차려낸 섬 밥상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염전도 안전하지 못하다
하지만 소금고사가 이어진 14년 동안 천일염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태양광 광풍이 소금밭에 몰아치면서 전국에 240여 개 염전이 문을 닫았다. 그중에 전라남도에만 200여 개 염전이 문을 닫았다. 최소 두 명이 염전을 운영한다면 480여 명, 많게는 4, 5명이 일을 한다면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여 명이 이상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2020년 천일제염 업체 수가 1000여 개였으니 태양광으로 바뀐 염전을 제외하면, 800여 개가 남아 있는 셈이다.
가장 염전이 많은 전라남도는 700여 개소가 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신의면에 200개 정도 염전이 있다. 심지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대동염전(신안군 비금면 소재)도 처음 지정된 면적 중 2/3는 태양광으로 바뀌었다.

내년에도 소금밭에서 만나고 싶다
“박사님, 내년에는 소금고사 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난 5월 박씨의 아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염전 일을 하면서 소금고사를 준비하는 일은 버겁다. 대부분 민속행사나 의례는 지자체나 문화재청 등의 지원을 받아서 준비하는데, 오롯이 한 가족이 10여년이 넘도록 소금밭의 전통을 지켜온 것만도 대단하다.
내년 5월에 다시 신안의 작은 소금밭으로 반갑게 만나고 싶다. 좋은 소금을 보내달라고 하늘과 바람과 땅에 술 한 잔 올리고 싶다. 소금밭을 지키는 한 가족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다. 아래 내용은 필자가 지난 5월 소금고사에서 읽었던 기원문의 일부다.
그런데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이제 고사상에 올릴 음식을 만들고, 소금밭을 찾은 분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버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일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어떤 지원도 없이 소금밭 가족들의 희생과 참여하신 분들의 열정으로 지난 10여 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그 멈춤이 결코 중단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멈춤은 다시 걷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걷는 방법이 바뀔 것입니다. 급하게 뛰어온 15년입니다. 박성춘 소금밭 장인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이제 소금밭에, 소금밭을 만든 사람들에게 또 갯벌과 바다에게 토판염을, 소금을 받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 볼 때입니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30여년 동안 섬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문화 관련 정책연구를 한 후, 지금은 전남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는 바다인문학, 바닷마을인문학,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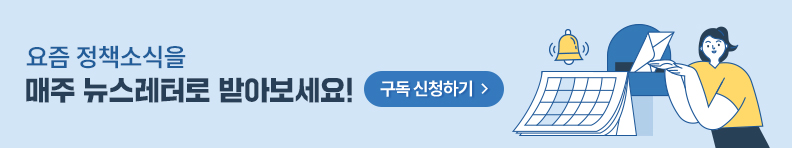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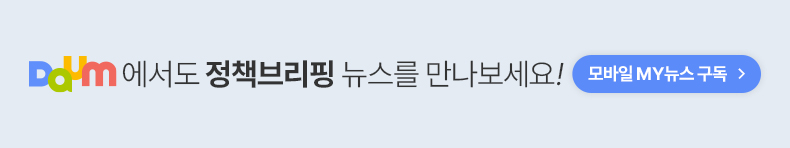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 뉴스위크 인터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12/8984513668bfcb5351ed652346d39d9f.jpg)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7/9cb9da1b11f3db7be804c8e18a080b6e.jpg)